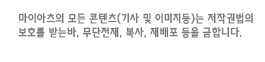- 작품명 :
- RunningSpongebob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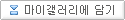
- 작가명 : 찰스장, 캔버스 유화 227.3 x 181.8cm 2008
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
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
- 작가노트
-
나에게 작업이란 나와 타인 그리고 이 세상을 알아가는 행위이자 즐거움이다.
작업 안에서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.
때론 작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정하지 아니하고 시작한다.
즉 어떠한 것도 새롭고 또 다른 것을 해내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.
어떠한 것도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.
예술은 인간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며, 상상력을 만들어 주며,
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.
- 작가 평론
-
글. 강은미
- 찰스장의 2008년도.
찰스장에게 올 한해는 작업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. 이 시기는 과거에 비해 작가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 시기이다. 즉, 단순히 작가의 갱ㄴ적인 함의의 발현이었던 작업이 비로소 하나의 객체가 되어 그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. 그건 무르 우리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면서 사회와 맞닥뜨리면서 겪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, 작가 찰스장과 그의 작품이 세상 안에서, 사회 안에서, 예술 안에서의 자리매김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.